경운궁이란?
임진왜란 뒤 선조가 월산대군의 집을 임시로 왕의 거처로 쓰면서 궁이 되었다. 1608년 선조가 죽은 뒤 광해군이 이 곳에서 즉위하였는데, 그해 완성된 창덕궁으로 떠나면서 경운궁이라는 궁호를 붙여주었다. 1623년에는 인조가 이 곳에서 즉위하였다. 또한,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곳이기도 하다. 1897년(고종 34)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이 궁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비로소 궁궐다운 장대한 전각들을 갖추게 되었다. 1904년 큰 화재로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되었으나, 1905년 즉조당·석어당·경효전·함녕전 등이 중건되었다. 1906년 동문 대안문 이 수리된 뒤 대한문으로 개칭하고 정문으로 삼았다. 1907년(순종 1) 순종 즉위 후 고종은 궁호를 경운궁에서 덕수궁으로 바꾸었다. 1611년 ~ 1615년에는 조선의 정궁, 1897년 ~ 1907년에는 대한제국의 황궁이었다.
경운궁 답사
대한문 앞에 놓여있는 금천교를 지나 중화문으로 갔다. 중화문은 팔작지붕에 다포양식에 겹처마였다. 옆의 건물은 최근에 지어진 듯 하다.
중화문을 지나 중화전 앞으로 갔다. 1902년에 처음 세워졌을 때는 본래 중층이었으나 1904년 화재로 1906년에 단층으로 다시 지었다고 한다. 돌마당에는 문무백관의 지위와 위치를 나타낸 품계석이 세워져 있다. 원래 중화전 주변으로 회랑이 있었으나 일제때 철거되었으며 현재 중화문 동쪽에 일부가 남아있다.
중화전 내부는 세로가 긴 일월오악도가 있었고, 새로 칠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다음은 석조전. 석조전은 대한제국기 동안에 지어진 것으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신고전주의 양식의 석조 건물이다. 대한제국의 고종황제가 집무실과 외국사신들의 접견실로 사용할 목적에서 지어졌는데, 1층에서는 시종들이 대기하고, 2층은 황제의 접견실, 3층은 황제와 황후의 침실과 응접실로 사용되었다. 석조전의 정원으로 영국인 하딩의 설계로 같은 기간에 서양식 정원과 분수대가 세워졌다. 석조전은 해방 후에는 국립박물관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궁중유물전시관이 있었으나 경복궁 자리로 이전하였다. 석조전 서관은 1937년 나카무라 요시헤이의 설계로 이왕직박물관으로 지어졌다. 1950년 한국 전쟁 중 전화를 입어 석조의 구조만을 남기고 전부 소실된 것을 1953년 수리하였으며, 이 건물은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가 찾아갔을때 석조전은 옛모습을 찾기 위해 공사중이었다. 2012년쯤에 복원이 끝난다고 하는데 저번에도 석조전을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쉽긴 했지만 원래모습을 찾는다니 기쁘지 아니한가?
다음은 즉조당과 준명당이었다. 즉조당과 준명당은 연결되있다. 준명당의 단청은 새로 칠한 티가 있는데, 즉조당의 단청은 칠 한지 꽤 오래 된 것 같다. 준명당은 앞에서 볼땐 一자이지만 뒤에서 보면 ㄱ자이다. 즉조당까지 연결되있는 다리까지는 새로 칠한것 같다. 멀리서 둘을 비교하면 즉조당은 단청을 칠하지 않은 것 같다. 둘다 주심포양식으로 겹처마였다. 즉조당 단청을 칠하지 않은 것 까지는 뭐라하지 못하겠지만, 창호지조차 찢어져있는 것은 보기좋지 않았다.
다음은 석어당. 석어당은1904년 화재로 원래의 건물은 불타고, 현재의 건물은 그해에 다시 지은 것이다. 중층 팔작지붕 집이다. 처마는 상하층 모두 겹처마이고, 지붕에는 망와(望瓦) 외에는 아무 장식도 없다. 이 건물은 현존하는 유일한 중층건물이며, 궁전건축이지만 권위주의적인 형식을 벗어나 순수한 재래식 민간건물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단청을 칠하지 않아 독특한 멋이 있다. 중층 다 주심포 양식이다.
다음은 함녕전. 함녕전은이 전각은 고종이 거처하던 곳으로, 임금자리를 순종에게 물려준 후 잠시 수옥헌에서 거처하였으나, 순종이 창덕궁으로 옮긴 후 다시 이곳에서 거처하다가 1919년 여기에서 승하하였다. 수옥전은 외곽건물에서 수옥전 까지 이어져 있는 계단이 있는 것이 독특했고, 벽에 황금 옷걸이 같은 것이 특이했고, 전등으로 추정되는 등이 있어 서양문화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덕홍전. 1904년 대화재 이후 경효전을 수옥헌 방면으로 옮긴 뒤, 1906년 지금의 덕홍전을 짓고 1911년 개조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덕홍전은 덕수궁에 현존하는 건물중 가장 나중에 지어진 건물인 셈이다. 덕홍전의 용도는 주로 외국사신들이나, 대신들을 만나던 접견실로 쓰였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덕홍전의 내부 전체는 넓게 터져 있고,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내부 모양 또한 접견실의 모습 그대로다. 또한 내부에는 봉황과 오얏꽃(李花) 문양 등을 화려한 금색으로 장식했음을 볼 수 있다. 천장엔 샹들리에 같은 등이 있어 함녕전 전등과는 다른 멋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정관헌. 서양풍의 건축양식에 한국의 전통 건축양식이 가미된 독특한 외관을 보여주고 있다. 건축 당시에는 고종황제의 여가장소로 지어졌으나 태조의 어진을 모시기도 했다고 한다. 정관헌은 일종의 정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덕수궁에서는 비교적 지대가 높고 아늑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침전과 외빈의 접대를 위한 함녕전 및 덕홍전 영역에서 가장 높이 위치하고 있어 앞을 굽어 볼 수 있으며, 행사를 위한 공간인 중화전 영역과 중화전 뒤편의 즉조당, 준명당, 석어당과도 잘 연계되어 있다.
정관헌 입구에는 석등이 두 개가 있었고, 기둥엔 박쥐와 꽃병, 오얏꽃무늬로 장식 되 있었다. 정관헌 뒤엔 문이 하나 있었는데, 차를 내오는 공간을 위한 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관헌 내부에도 기둥이 있었는데, 이 기둥은 자연석재가 아니고 인조석재로 로마네스크 이둥이라고 한다. 내부로 들어가는 신발을 신고 관람하려 하는데, 발은 꽁꽁 얼어있어 얼마 보지 못하고 바로 내려왔다.
추위도 녹일 겸 외로히 코코아 한 잔을 마시며 추위를 녹이고 마지막으로 광명문으로 갔다.
석조전 앞 얼어버린 연못을 가로질러 광명문에 다다렀다.
광명문은 원래 함녕전의 문이었으나 지금은 함녕전과 멀리 떨어져 석조전 맟은편에 있다. 광명문은 지금은 그 본래 기능과 달리 흥천사 종과 자격루, 신기전 화차를 전시하고 있다. 광명문은 칠을 하지 않아 매우 낡아보였다. 가뜩이나 주인인 함녕전을 읽은 슬픔도 큰데 칠가지 장 안 되있으니 광명문은 한스러울 것 같았다.
느낀점
경운궁은 익히 대한제국의 황궁으로의 역할을 수행하며 근대화의 바람을 직접 맞은 곳이다. 그러므로 건물들엔 근대양식도 남아있지만, 한편으론 근대화의 바람에 엄청난 손상을 입은 비운의 궁이기도 하다. 또한 국난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 한 광무황제의 이상이 담겨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비록 그 원대한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분의 고귀한 정신을 덕수궁을 보며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분의 뜻을 약간이나마 이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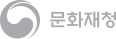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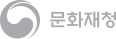




 홈
홈